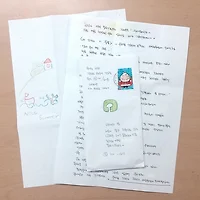아버지의 도시락
글 한애선 한살림여주이천광주 조합원
지금은 초등학교라 불리는 어린 시절의 국민학교는, 한 반에 70명이 모여 있어 콩나물 시루 같았다. 학생 수에 비해 교실이 턱없이 부족해 오전반과 오후반도 있었고 학교 앞에서 파는 군것질거리는 떡볶이가 고작이었으며, 비릿한 냄새가 나던 비닐 포장의 서울우유 급식이 가장 호사스런 간식일 정도로 뭐든 물자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무상급식으로 잘살건 못살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따뜻한 점심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던 때라 집안 형편이 도시락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나와 남동생도 도시락을 싸보려고 부엌에서 애만 쓰다가 빈손으로 학교를 간 적이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나는 점심시간에 반 친구들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애써 태연한 척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친구가 아버지가 오셨다고 나가보라고 했다. ‘바쁘신 아버지가 무슨 일로 오셨을까?’ 운동장에 쭈뼛거리며 나가보니 운동장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도시락 두 개를 들고서...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은 당시 유행하던 직사각형의 걸쇠가 있는 검은 보온 도시락이었다. 손짓하며 기다리고 서 계시는 아버지한테 가서 도시락을 받아들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되돌아가시던 아버지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남동생에게 도시락 하나를 전해주고 내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밥을 짓자마자 가지고 오셨기 때문인지 하얀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시금치나물과 어묵볶음도 있었다. ‘아침에 먼저 나가셨던 아버지가 언제 집에 가셔서 밥을 하셨을까? 시금치와 어묵은 언제 사서 반찬을 만들어 오셨을까?’
맛있다거나,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기쁨보다는 그 도시락을 전해 주고 서둘러 가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영화가 끝난 스크린의 잔영처럼 남아 미세한 여러 감정들로 마음이 먹먹했다. 아버지의 점심 도시락을 받던 그 날, 그 기억이 내가 아버지를 추억하는 가장 좋아하는 기억 중에 하나이다.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탓에 패스트푸드를 빨리 접하고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다보니 내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낳은 아이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한살림 덕분에 무농약 양육, 전환기 양육, 유기농 양육으로 서서히 바꿔가고 아이들이 건강해지니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 생각이 난다. 어린 나이에 홀로 월남하여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기댈 곳 없는 서울살이를 하게 되셨던 아버지는 이북출신답게 동치미를 유난히 시원하게 잘 담그셨다. 환갑을 병원에서 맞으시고 그 길로 떠나신 아버지. 힘들 때마다 지탱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 삶을 온전히 내어준 아버지의 밥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한살림 물품 써보니 어때요? > 독자가 쓰는 사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 인생의 이 물품] 둘째의 알레르기를 낫게 해 준, 오미자음료 (0) | 2012.12.31 |
|---|---|
| [내 인생의 이 물품] 우리집 기관지 주치의, 배농축액과 도라지청 (0) | 2012.11.05 |
| [내 인생의 이 물품] 따뜻한 떡에 한살림 쌀조청~ 꿀보다 조청입니다^^ (0) | 2012.08.02 |
| [잊히지 않는 밥 한 그릇] 한살림 가득한 밥상차림! (0) | 2012.08.02 |
| [내 인생의 이 물품] 엄마의 유산, 한살림 고추장 (0) | 201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