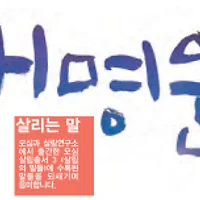우리 옛 어른들은 ‘님’이라는 말을 참 즐겨 쓰셨지요. 집안 식구들을 부를 때에 할머님, 할아버님,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형님, 누님에 이르기 까지, 매일 얼굴 마주 보며 모든 일을 함께 나누는 친한 사이끼리도 ‘님’ 을 붙여 부르는데 익숙했습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해님, 달님, 별님, 비님에 이르기 까지 자연만물에도 ‘님’ 을 붙여 부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처음 보는 낯선 길손에게도 손님이라 부르며 높였는데요, 처음 들어 간 중학교 영어시간에 가장 놀라웠던 일 중의 하나가 존칭이 따로 없어 부모의 이름을 흔히 부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님’ 의 옛말은 ‘니마’ 라고 하는데 태양신을 가리키는 것이라지요. 우리 민족이 상대방을 부르는 끝말에 ‘님’ 을 붙인 것은 상대방을 태양신과 같이 높이 우러르는 공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사람과 생명, 자연만물에 대한 경시가 널리 퍼져있는 세태를 보면 과연 그런 마음이 그때라고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내 판단에 못마땅한 면이 있어도 나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받들어 모시고자한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신의 외양이 어떻고,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이 안에 모시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인정하고 공경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붙이는 ‘님’ 이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그 대신 딱히 무어라 부르기 난처할 때 이름 뒤에 장식음처럼 붙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꼽인사와 함께 부르는 ‘~고객님’이 그렇고 아무에게나 붙여 부르는 사모님, 사장님,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비님이 오신다’ 는 말은 여간해서는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아련해지면서 따뜻한 공기에 싸여 어린 시절로 훌쩍 시간이동을 한 것 같은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때로는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아름다운 생각이 가득하면 고운 말과 행동이 나오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꽃을 싼 종이에서는 꽃내음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포함한 누군가를 ‘~님’ 이라고 부르면서 온 마음으로 모시고 받들겠다는 생각을 함께 한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곳을 생명살림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글을 쓴 윤선주님은 도시살이가 농촌과 생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으로 초창기부터 한살림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한살림연합 이사로 일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자취 > 살리는 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살리는 말> 생명운동 (0) | 2011.11.30 |
|---|---|
| <살리는 말> 한살림 (0) | 2011.11.01 |
| <살리는 말> 기룸 (0) | 2011.09.01 |
| <살리는 말> 모심 (0) | 2011.07.27 |
| <살리는 말> 살림 (0) | 2011.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