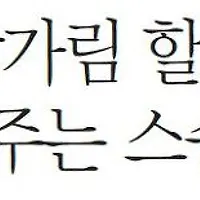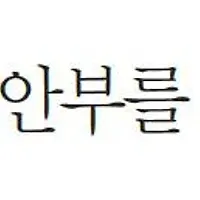글 한창훈
‘내 어렸을 때 아이들은 모두 결핍 덩어리들이었다. 빼빼 마른 데다 비리비리했다. 툭 하면 뾰두라지가 나고 버짐이 피었으며 기계충을 앓았다. 그때 주로 먹은 것이 보리나 조, 수수, 고구마, 돼지감자 같은 거였다. 지금은 모두 건강식으로 구분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렇게들 아프고 볼품없었다. 이 애들이 딱 한 번 좋아지는데 바로 추수 이후다. 쌀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흘만 쌀밥을 먹으면 살이 붙어 얼굴 때깔이 달라지고 이런저런 잡병이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쌀밥을 최고로 친다…’ 오래전 소설가 남정현 선생께서 강연 때 하신 말씀이다. 결핍의 대명사였던 거친 곡식들이 갑자기 건강식품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만난 음식의 풍요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과잉 때문에 병이 생긴다 . 나도 오랫동안 마시고 피워온 몸이라 이런저런 탈이 났고 그것 때문에 잡곡을 사 들고 온다. 만나는 의사마다, 뭐 좀 안다는 사람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 채널마다 그런 것을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한다(웃기는 게 이 텔레비전이다. 성인병과 현대인의 질병 특징에 관해 설명하면서 과식 안 해야 하고 고기 덜 먹어야 하고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떠들고 나서 광고한 다음 기다렸다는 듯이 이른바 맛집 소개를 한다. 잔뜩 삼켜대는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찾아가 먹어보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내게는 쌀밥이 최고다. 원고를 마치고 나가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좋지않아 허기가 지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위로해줄 필요가 있을 때 쌀밥을 짓는다. 김이 오르는 고슬고슬한 밥.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풍미.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다. 이걸 먹으면 힘이 난다. 남정현 선생이나 나뿐만이 아니다. 예전에는 쌀밥의 힘을 확인하기 쉬웠다. 정태춘의 노래처럼 ‘이 땅이 좁다고 느끼던 시절 방랑자처럼 떠돌’ 때 만났던, 일하는 사람들의 고봉밥만 떠올려 봐도 그렇다. 초록색 논을 배경으로 허리 굽히고 있던 농부나 공사현장, 이런저런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밥이 힘쓰지 사람이 힘쓰는 줄 알아?’ 소리를 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잔뜩 밥을 담아주고 일을 시켰다. 밥을 먹고 나서 다음 밥을 벌기 위해 수고를 하는 존재. 하긴 그게 사람이었다. 고기보다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더 빨리 전환된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밥에는 그런 물리적인 원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나는 밥 차려주는 손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러 번 떠든 적이 있다. 그 손에 모성과 휴머니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가엽게 바라보는 마음. 이를테면 이런 풍경이 있었다. 지금 나는 고향 섬에서 살고 있다. 예전에 마을과 떨어져 고개 너머에서 외따로 살 때였다. 그런 곳은 겨울이 오면 아주 혹독해진다. 춥고 쓸쓸하다. 며칠 버티다가 마을로 내려가면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 차려온 밥상. 겨울밤 찬바람이 지붕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아래서 받아 든, 톳나물 무침에 어묵국, 파김치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윤기 흐르는 쌀밥 한 그릇. 그러면 나는 공연히 할머니 손을 붙들고 일분쯤 있곤 했다. 지금도 종종 떠오른다.
글을 쓴 한창훈님은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가던 새 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청춘가를 불러요> 등과 장편 <홍합>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열 여섯의 섬> <꽃의 나라>를 낸 소설가입니다. 산문집으로는 <한창훈의 향연> <내 밥상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위의 자산어보>가 있습니다. 한겨레문학상, 요산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등을 받았으며 현재 고향인 전남 거문도에서 살며 바다의 생명력 가득한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 살림의 마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구를 살리는 진짜 농부 (0) | 2014.12.10 |
|---|---|
| 천벌 받을 짓 그만해라 (0) | 2014.11.17 |
| 제 앞가림 할 힘을 길러주는 스승 (0) | 2014.10.15 |
| 밥의 안부를 묻다 (0) | 2014.08.12 |
| 와서 밥 먹어요! (0) | 2014.07.08 |